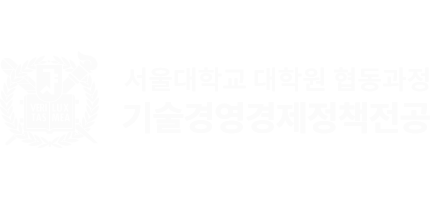[이종수 교수님 연구실] Analysis on the acceptance of coal phase-out policy considering public preferences: Policy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 based on empirical evidence from South Korea
이종수 교수님 연구팀(수요예측연구팀) 연구활동
<연구결과 개요>
[주요 결과 표 및 그림]

1. 연구배경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석탄 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coal phase-out)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닌 경제적 비용, 고용 문제, 지역사회 수용성 등 복합적 사회경제적 도전을 수반한다.
한국의 경우 석탄 발전 비중이 여전히 높으며, 구체적인 폐지 로드맵이 명확하지 않아 정책 수용성 확보가 전환의 관건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의 선호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요인을 반영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정책 설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이산선택실험(Discrete Choice Experiment, DCE)을 수행하여 석탄 폐지 정책의 주요 속성별로 국민의 선호를 측정하였다. 정책 속성은 퇴역 용량(capacity), 발전소 위치(location), 유휴 부지 활용계획(site utilization), 퇴역 시기(decommissioning period), 노동 전환율(labor conversion rate), 월간 전기요금 인상(cost)의 여섯 가지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응답 표본은 성별·연령·지역을 기준으로 층화표집되었다. 선택집합은 무작위로 설계된 두 개의 정책 대안과 하나의 현상유지(status quo) 옵션으로 구성되었고, 각 응답자는 총 8개의 선택문항에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선택행동은 랜덤효용이론(Random Utility Theory)을 기반으로 한 혼합로짓모형(Mixed Logit Model)을 통해 분석되었으며, 이를 통해 개인 간 선호의 이질성을 반영한 효용함수를 추정하였다. 또한 추정된 한계효용계수를 이용해 각 속성별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 WTP)을 산출하고, 정책 대안의 조합에 따른 수용률을 시뮬레이션하였다.
3. 분석결과
분석 결과, 노동 전환율과 유휴 부지 활용방식이 정책 수용성을 가장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중이 단순한 환경 개선뿐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사회 이익의 공유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퇴역 부지를 문화복합시설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전환하는 대안이 가장 높은 선호를 받았으며, 이는 에너지 전환이 단순한 탈탄소화 과정을 넘어 지역사회 재생(Local Regeneration)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전기요금 인상은 정책 수용성을 감소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월 요금 인상액이 2달러를 초과할 경우 수용률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대중의 민감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보여주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요금 조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퇴역 용량이 클수록 정책 수용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 폐지(stepwise phase-out)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노동 전환율이 50%에서 90%로 증가할 경우 정책 수용률이 약 22%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유휴 부지를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전환할 경우 수용률이 12.3%, 문화복합시설로 전환할 경우 15.7%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분석에서는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강원도와 충남 지역의 수용률이 낮았고, 수도권 지역의 수용률이 높게 나타나 물리적·심리적 거리감(perceived distance effect)이 정책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석탄 폐지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이 환경적 요인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중은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보호를 중시하며, 이는 정의로운 전환이 단순한 보상정책이 아니라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핵심 메커니즘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석탄 폐지 정책은 고용 안정성과 유휴 부지의 사회적 활용, 단계적 요금 조정, 지역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4. 경영 및 정책적 시사점
대중의 선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석탄 폐지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최초의 실증 연구 중 하나로서, 탈탄소화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향후 에너지 전환정책이 사회적 공정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론적·정책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형 정의로운 전환 프레임워크 수립, 에너지 전환 관련 법제 설계, 지역 맞춤형 탈석탄 전략 수립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대중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논문 정보>
Moon, S., Lee, J., Kim, J., & Choi, H. (2025). Analysis on the acceptance of coal phase-out policy considering public preferences: Policy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 based on empirical evidence from South Korea. Energy Economics, 145, 108453. https://doi.org/10.1016/j.eneco.2025.108453
<용어 정리>
▶이산선택실험(DCE, Discrete Choice Experiment): 응답자가 주어진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선호를 추정하는 실험적 조사기법
▶ 혼합로짓모형(MXL, Mixed Logit Model): 개인 간 선호의 이질성을 반영하기 위해 효용계수를 확률분포로 가정한 확장형 로짓모형
▶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지역사회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적 개념
▶ 지불의사금액(WTP, Willingness to Pay): 특정 정책 변화에 대해 개인이 감수할 의향이 있는 금전적 가치